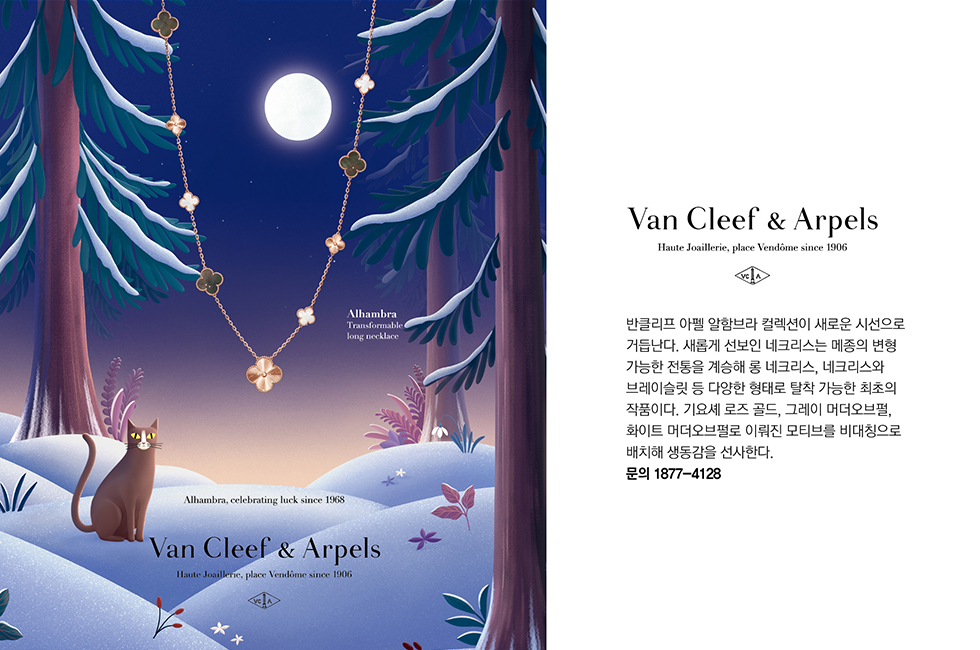10월 01, 2011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창조적 감성이 풍부한 도시 런던에서 빼어난 창의성과 남다른 손재주를 지닌 4명의 젊은 디자이너가 펼치는 도전이 시선을 끈다. 템스 강변에 자리한 디자인 뮤지엄에서는 이곳에서 직접 선발하고 후원하는 신진 디자이너 4명의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전시가 한창이다. 대량생산되는 디자인의 홍수 속에서 사용자와 보다 친밀한 호흡을 일궈내는 개성 돋보이는 제품을 ‘불완전함’이란 주제 아래 풀어낸 이들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아직은 풋내 나는 젊은 피가 세상을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신선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완전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더욱 아름답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젊음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미숙하지만 열정적인 피가 단지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매력을 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결점투성이 세계를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몹시도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런던이라는 도시는 가끔 젊은 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유의 새롭고 즐거운 창조적 쾌감을 맛볼 수 있는 역동적인 장소다. 물론 셀 수 없이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 다문화 사회의 특성으로 때로는 유혈 사태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게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참신한 다채로움이 가득한 이 도시에는 오색 찬란한 재능의 싹을 순수하게 바라봐주는, 편견이 많이 배제된 호기심 어린 시선이 뒷받침되기에 창조적 영감을 머금은 도전적인 꽃이 쉼 없이 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다양한 젊은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고자 런던의 디자인 뮤지엄(Design Museum)에서는 ‘디자이너스 인 레지던스(Designers in Residence)’라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런던에서 활동하는 4명의 신진 디자이너를 선발해 ‘불완전함의 추구(In Pursuit of Imperfection)’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량생산 제품의 홍수 속에서 오차 없이 기계로 찍어내기는 힘들지만 사용자와 호흡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이 살아 숨 쉬는 작품을 선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그 일환으로 디자인 뮤지엄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4개의 작품은 변화무쌍한 얼굴을 가진 시계와 등받이 없는 가죽 의자,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버려진 재료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업사이클링’ 제조 라인, 표면이 부식된 금속을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이다. 내년 1월 22일까지 열리는 이 ‘젊은 전시회’에 소개된 4인4색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낡은 가구의 잔재를 근사한 ‘디자인 판지’로 승화시키다, 윌 섀넌


1 윌 섀넌 (Will Shannon), 모바일 파티클 보드 공장(Mobile Particle Board Factory).’
2 섀넌은 목재 가구에서 나온 낡은 재료를 독특한 ‘빈티지’ 느낌의 판지용 펄프로 만들어내는 장비를 탄생시켰다. 1번 사진의 전등과 탁자도 마치 고물상이 끌고 다니는 장난감 수레처럼 보이는 이 설비로 만든 가구다.
‘도대체 이게 무엇으로 만든 물건이지?’ 알갱이가 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울룩불룩한 하얀색 탁자와 재색 바탕에 진한 노란색을 발하는 전등은 제법 운치가 있다. 한지를 물에 녹여 뭉쳐놓은 듯한 동양적인 분위기도 배어나온다. 보통 눈썰미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 빚어낸 물건인지 알기 힘들다. 이름하여 ‘모바일 파티클 보드 공장(Mobile Particle Board Factory)’. 알고 보니 독특한 재료와 그 재료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작품’이나 마찬가지란다. 해묵은 목재 가구에서 나온 낡은 재료를 판지용 펄프로 거듭나게 한 실용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보통은 쓸모없다고 여기는 갖가지 재질의 목재 가구에서 얻은 입자 고운 재료를 두루 섞어 독특한 느낌의 판지(chipboard) 펄프를 얻었죠. 이렇게 만든 판지 재료에는 원래 목재의 흔적이 엿보여 색다른 분위기를 풍겨요. 판지는 밀리미터 단위로 완벽하게 생산하는 고도의 산업화가 탄생시킨 산물이지만, 가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재료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국의 걸출한 조각가 앤서니 곰리의 조수로 일하다가 현재 디자이너 마르티노 갬퍼의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윌 섀넌(Will Shannon)은 이렇게 말했다. 섀넌의 작품 세계를 보노라면 최종 결과물인 가구도 재미있지만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도구에 더 흥미가 느껴진다. 그래서 ‘섀넌표’ 판지 펄프로 제작한 탁자와 전등 옆에는 드럼통과 양동이 등 온갖 잡동사니를 얹어놓은 듯한 수레 모양의 장비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고물상이 끌고 다니는 장난감 수레처럼 보이는 이 기계를 활용해 가구 재료를 만드는 공정은 디자이너와 가구를 만드는 장인, 제조업체의 역할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주는 작은 작업장인 셈이다.


3 박혜연 (Hye-Yeon Park), ‘미스터 클락(Mr. Clock)’.
4 센서의 작용으로 단지 시각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웃는 얼굴이나 기호, 영자 단어 등을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시계.
“시계도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놀 수 있다!” 그렇다. 시계라고 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디자인 뮤지엄의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물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관람객들이 유난히 많은 건 단지 시각 정보만을 보여주지 않고 혼자 즐겁게 놀고 있는 듯한, 또는 ‘같이 놀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시계의 변화무쌍한 매력 때문이다. ‘미스터 클락(Mr. Clock)’이라고 불리는 이 시계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센서로 인지해 다양한 패턴을 보여준다. 단순한 기호도 있고,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도 있고 ‘good’, ‘bye’ 등 영어 단어도 있다. 물론 사람이 다가서면 시간도 보여준다. ‘천의 얼굴’을 연상케 하는 매력 만점 시계를 만든 주인공은 한국 출신의 박혜연 디자이너. 홍익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영국의 명문 예술 대학원 왕립예술학교(RCA)를 졸업한 그녀는 지난해 동기 동창인 윌 섀넌과 나란히 RCA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인 ‘RCA 디자인 프로덕트 컬렉션(RCA Design Products Collection)’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출품한 작품도 시계였다. 숫자가 초 단위부터 변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과정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사이 시계(In-betweening Clock)’ 는 2011년 ‘올해의 디자이너상’ 후보에도 올랐다. “시계와 인연이 있나 봐요(웃음). 시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한 것이 바탕이 되었죠. 우리는 세상을 인간에게 편리하게 조정하는 도구로서의 디자인을 통해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시간만은 예외죠. 인간의 지시 없이도 움직이는, 제어하기 힘든 메커니즘이니까요.” 지난 1년여 동안 숫자와 사람을 놓고 많은 생각을 쌓아왔고, 그러한 단상들을 스케치로 옮겨왔다는 그는 그동안 시계 디자인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와 개념의 일부분을 응용해 달력과 카드를 생산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삶은 가죽으로 엮어낸 의자, 사이먼 하산


5 사이먼 하산(Simon Hasan), 가죽 스툴.
6 가죽을 삶아 좀처럼 변형되지 않는 단단한 형태로 가공하는 ‘퀴르 부이(cuir bouilli)’ 기법으로 제작한 등받이 없는 의자.
등받이가 없는 의자(stool)라고 고급스럽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딱딱하고 견고한 가죽을 입혀 근사한 자태를 뽐내는 데다가 표면의 안정감까지 더해져 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사이먼 하산(Simon Hasan)의 가죽 스툴은 고전과 현대의 느낌이 조화를 이루며 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보이는 장점을 지녔다. 그가 이 특별한 의자를 위해 사용한 기법은 가죽을 삶아 좀처럼 변형되지 않는 단단한 형태로 가공하는 ‘퀴르 부이(cuir bouilli).’ 중세에 갑옷이나 방패를 제작할 때 장식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활용하던 방식이라고. “구조적으로나 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질 높은 가죽 의자를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게 되었답니다.” 2008년 RCA를 졸업한 사이먼 하산은 가죽을 좀 더 멋지고 실용적으로 가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는데 퀴르 부이 기법을 적용해 명품 가죽 제품의 대명사인 펜디와도 작업한 바 있다. 가죽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삶은 뒤의 질감과 느낌이 달라진다고. 이번에 그는 금속을 모래 주형에 부어 제작한 틀에 전기 도금 방식으로 만든 놋쇠 다리를 달아 나무와의 대조적인 조화미를 추구하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 향상도 도모했다고 한다. “디자인 업계에는 전통 공예품과 공업화의 격차에 따른 불완전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제 작업은 장인 정신이 깃든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과 대량생산의 접점을 창출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생산 기법을 개발하면 상업적인 가능성도 지니면서 전통미도 담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침식된 행성을 닮은 전등 갓, 제이드 폴라위요



7 제이드 폴라위요(Jade Folawiyo), 전등 갓.
8 폴라위요는 금속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녹슬게 하는 방식으로 다채롭고 신비한 색깔을 얻어낸다.
9 표면이 부식된 금속을 바탕으로 만든 폴라위요의 전등 갓.
“물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결함도 불완전한 속성이 있죠. 저는 언젠가 녹슨 문을 보고는 그러한 결함이 디자인 제품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이 같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불완전한 표면의 흠에 대한 관심은 제이드 폴라위요(Jade Folawiyo)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금속을 부식시키는 실험을 일삼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금속의 표면을 변색하거나 녹슬게 하는 방식으로 독특한 표면 마감 처리 효과를 얻는 자신만의 디자인 기법을 터득하게 된 것.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작품도 이러한 ‘금속 부식’ 기법의 산물로, 마치 아름답게 침식된 행성의 표면을 연상케 하는 전등 갓이다. 오묘한 청록색과 갈색, 연녹색의 조화가 이색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뿜어내는 작품이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실험을 하면 할수록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속의 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색상과 무늬를 제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생각지도 않았던 멋진 색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힘들지만 즐거운 여정이었죠.” 런던에서 성장했지만 나이지리아 출신의 부모를 둔 제이드는 자신의 뿌리인 아프리카 특유의 정서가 담긴 창조적 감성을 지녔다. 이탈리아 베네통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센터인 파브리카에서 1년을 보낸 덕분에 유리와 자기 다루는 법을 익혔고, 이제는 금속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는 그는 이 노하우를 활용한 후속 작품을 전시회에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녹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강철 꽃병과 놋쇠로 만든 휴대폰 케이스가 올가을 선보일 작품. “천편일률적인 녹갈색이 아니라 저마다 미묘하게 다른 색깔들이죠. 놋쇠에 새긴 무늬도 유일무이한 것이고요. 개성을 추구하는 대중에게 걸맞은 제품을 선보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