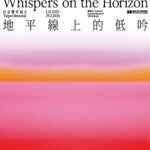현대미술은 타이베이의 풍경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을까?
타이베이는 여러모로 풍성한 고유의 문화적 매력을 지닌 데다 이방인도 편안함을 느낄 만한 개방성도 겸비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 면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는데, 이제 ‘아트 피플’의 일정표에는 1월부터 타이베이가 ‘후보 목록’에 올라가 있을 성싶다.
지난해 출발한 현대미술 장터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아트 페어를 계기로 이 도시의 문화 예술 생태계가 연초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
아직 확언하기엔 이르지만 ‘잘 만든 행사 하나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띄운다’고 할 법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트 페어의 내실 있는 콘텐츠와 더불어
점차 풍성해져가는 각종 문화 예술 공간은 미식의 도시답게 맛난 먹거리, 온화한 날씨에 더해 방문객의 발걸음을 즐겁게 만든다. 그 현장을 소개한다.
지난 1월 16일 오후, 타이베이 난강 전시 센터. 올해로 2회를 맞이한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i·台北當代) 아트 페어(1. 17~1. 19)의 VIP 프리뷰가 진행되는 날. 미술품을 사고파는 세련된 장터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아트 페어가 대개 그러하듯 잘 차려입은 ‘아트 피플’이 몇 겹씩 줄을 선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자못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지난해 첫 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양호한 출발’이라는 호평이 자자했기에 살짝 궁금하던 터였다. 사실 커다란 사각형 공간에 갤러리들이 부스를 줄지어 차리는 아트 페어의 풍경이란 게, 자주 다니다 보면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기대를 품게 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더구나 타이베이 당다이는 참가 갤러리가 99개로, 규모 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아 두어 시간이면 너끈히 ‘섭렵’하리라 생각했다. 유럽의 대형 아트 페어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 바젤 홍콩처럼 2백 개가 훌쩍 넘는 부스를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그런데 예상외로 ‘발품’을 파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양보다 질이라고 했던가. 세 자리 숫자가 아니어도 콘텐츠의 ‘영양가’가 꽤 높은지라 몇 시간에 걸쳐 한 바퀴를 돌아도 충분치 않았다. 그래도 한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에 대형 아트 페어에 비해 피로도는 덜한 편이었다. 먹을 것이 많은 잔치라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뭐가 됐든 대부분 ‘작고 알찬’ 공간을 선호하는 편이라 부디 이 크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들었다.
‘작지만 강한’ 아트 페어, 타이베이 당다이의 매력
다행히 이 아트 페어를 만든 이들도 일단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맥락에 맞는, 대만 시장과 어울리는 페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커다란 규모로 키울 야심은 없습니다. 규모가 커지더라도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아트 바젤 홍콩 초창기 멤버로 타이베이 당다이를 설립한 영국인 문화 사업가 매그너스 렌프루(Magnus Renfrew)는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무조건 장터 규모를 키우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며 ‘품질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사실 대만은 언뜻 쉽지 않아 보이는 시장이다. 타이베이의 컬렉터들이 은근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선입견이 있었고, 기존에 아트 페어가 없는 것도 아닌 데다, 중국 대륙과의 오래된 긴장 관계가 큰손 컬렉터를 불러들이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그런데 의외로 중국에서 찾아온 미술품 컬렉터가 꽤 많았고, 자국민은 물론 한국, 일본, 홍콩 등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타이베이 당다이의 손님 목록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호응을 이끌어낸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만 한다. 우선 냉정한 시각을 제공해줄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아트 갤러리와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전문성 뛰어난 ‘팀’ 역량이 중요하다. 컬렉터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아트 페어에 참가하는 갤러리 구성이 좋아야 기꺼이 지갑을 열 테니 말이다. 이 점에서 타이베이 당다이 팀은 단연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 현대미술계의 큰 후원자인 스위스 은행 UBS를 메인 스폰서로 영입했고 가고시안, 하우저 & 워스, 데이비드 즈워너, 리먼 머핀, 갤러리 페로탱, 페이스 갤러리,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 리손 등 쟁쟁한 글로벌 갤러리들이 부스를 차리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국제, 조현, 아라리오, 원앤제이, 휘슬 등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 시장에서 인맥과 노하우를 쌓아온 매그너스 렌프루와 더불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는 공동 디렉터로 선임된 로빈 페컴(Robin Peckham)의 조화로운 역할이 컸다. 영국 출신이지만 일찍이 아시아로 넘어온 로빈 페컴은 기자회견에서 말을 꺼낸 순간 현지인 못지않게 유창한 중국어(만다린어) 실력으로 좌중을 놀라게 했다. 그는 미술 전문지 편집장, 독립 큐레이터 등의 경력으로 다져진 30대의 젊은 인재다.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2인조 디렉터는 올해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꾸리기 위해 크게 세 부문(메인에 해당되는 ‘갤러리즈(Galleries)’ 부문, 1명의 작가에게 집중하는 ‘솔로스(Solos)’ 부문,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유망한 신진 갤러리를 소개하는 ‘영 갤러리즈(Young Galleries)’ 부문)으로 구성된 부스 공간만이 아니라 전시장 곳곳과 도시의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을 장식한 대만 아티스트 마이클 린의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 도시 여기저기에서도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또 문화 예술계의 이슈를 탐색해볼 수 있는 IDEAS 포럼을 한층 심도 있게 꾸렸는데, 올해는 최근 영국의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을 공동 수상한 젊은 아티스트 오스카 무리조(Oscar Murillo)가 발표자로 참가하기도 했다.
도시 풍경을 다채롭게 물들이는 현대미술
마침 1여 년 전 국제갤러리(서울 소격동)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오스카 무리조를 만났다. 콜롬비아 출신으로 10대 초반 런던으로 이주한 뒤 아티스트로 성장한 그는 런던만이 아니라 뉴욕, 브뤼셀 등 지구촌 유수 도시를 누비면서 활동하는 코즈모폴리턴 작가. 당다이 아트 페어가 열린 첫 날 38만달러에 작품이 팔린 그는 타이베이라는 도시는 개방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사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소용돌이처럼 몰아친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 역사의 아픔을 안은 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릴 만큼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독재정치와 도시화의 그늘로 또 다른 시련을 감내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닮은 면이 많다. 그런데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사회·문화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성을 품고 있다. 사실 으리으리한 규모나 외양으로 압도하는 현대미술 공간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MOCA 타이베이같이 진중한 주제 의식을 내세우면서도 대중과 평단에서 동시에 호평을 받는, ‘작지만 알찬’ 미술관이 젊은 세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고, 최근에는 개성 있는 갤러리나 민간이 운영하는 매력적인 미술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여름 문을 연 윈싱 아트 플레이스 아틀리에(Winsing Art Place Atelier)가 좋은 예다. 깔끔하고 우아한 전시장과 함께 카페, 서점 등이 들어서 있는 비영리 문화 예술 공간으로, 현대미술 애호가 제니 여(Jenny Yeh)가 운영하는 곳. 개관전으로 더그 에이큰(Doug Aitken), 두 번째 전시로 양혜규 개인전이 열렸고, 현재 타이베이 당다이의 개막과 맞물려 베트남계 덴마크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인 보(Danh Vo-)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오는 4월 5일까지). 세련된 방식으로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저트 아트 뮤지엄(Jut Art Museum)도 주목할 만하다. 존 밀턴의 고전 소설 <실락원>에서 제목을 딴 기획전 <Paradise Lost>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다(오는 4월 5일까지). 현지에 기반을 둔 갤러리들의 약진도 타이베이를 위시한 대만의 아트 지형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대만을 비롯해 다양한 아시아 작가를 만나볼 수 있는 아시아 아트 센터(Asia Art Center), 프로젝트 풀필 아트 스페이스(Project Fulfill Art Space), 린 & 린(Lin & Lin), 이치 모던(Each Modern), 에슬리트 갤러리(ESLITE Gallery), 티나 켕 갤러리(Tina Keng Gallery) 등을 꼽을 수 있다. 혹시 타이베이 아트 투어를 시도한다면 당다이 아트 페어처럼 그리 복잡하지 않은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아트 페어의 아이콘’, 매그너스 렌프루의 미소
사실 타이베이는 글로벌 아트 페어를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도시’였을지도 모르겠다. 타이베이 당다이가 열리기에 앞서 이 떠오르는 아트 페어에 대해 심층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에서 언급됐듯, 정치적인 다양성이 존재하고(정치판이 시끄럽기는 하지만) 외부인에게 열려 있는 편이고, 추세도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 내수 시장의 컬렉터층(젊은 부유층 애호가도 많은 편)이 형성되어 있는 등 주변 인프라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단지 그동안 ‘아트 허브’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은 홍콩이나 고공 행진을 펼쳐온 중국 작가들의 몸값 등에 가려진 면이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만, 첫해에만 2만8천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인 타이베이 당다이는 2020년에는 4만1백92명이라는 더욱 고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부스 매진’이나 주요 작가들의 빼어난 판매 실적을 발표하며 축포를 터뜨리는 갤러리도 눈에 띈다. 올해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아트 페어를 시작할 예정이며, 한국 시장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매그너스 렌프루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아트 페어의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갤러리들의 부재가 못내 아쉬울 때가 많은 우리 아트 페어의 현주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