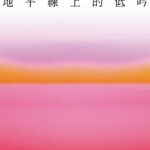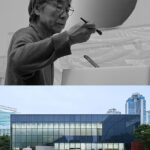7월 05, 2019
글 김현경(큐레이터) edited by 고성연
20세기가 ‘초대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도시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1세기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이 도시에 거주했지만,
오늘날엔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현실을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한 영리한 ‘도시 브랜딩’, 그리고 그 속을 채운 문화 콘텐츠가 갈수록 중시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트 도시’라는 수식어를 둘러싼 경쟁이 제법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는 영화제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젠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성과 포용력으로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오늘날엔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현실을 보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한 영리한 ‘도시 브랜딩’, 그리고 그 속을 채운 문화 콘텐츠가 갈수록 중시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트 도시’라는 수식어를 둘러싼 경쟁이 제법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는 영화제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젠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성과 포용력으로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요즘 부산은 아트 신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여름 을숙도에 들어선 부산현대미술관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관람객 13만 명을 동원했고, 국내 주요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한 아트부산(Art Busan)의 성공을 계기로 수도권 갤러리의 부산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항구도시에 꽤나 흥미로운 미술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근현대미술의 보고로 여겨지는 대구처럼 미술품 애호가의 ‘내공’이 탄탄하지도 않고, 광주처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글로벌 비엔날레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의 미술 풍경을 보노라면 꿈틀거리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성공적 ‘브랜드’ 아트 페어의 힘
세계 미술 생태계를 보면 크게 아트 페어, 비엔날레, 옥션, 세 축으로 돌아간다. 이 중 아트 페어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순히 ‘큰손’ 컬렉터의 취향을 반영하고 세계적 ‘유행’을 좌우하는 현대미술 장터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역량 있는 젊은 작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녹아든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최신 이슈를 진지하게 논하는 담론을 펼칠 수 있는, 다각적 역할을 해내고있기 때문. 한 예로, 홍콩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 허브’로 거듭난 데에는 아트 페어가 한몫 톡톡히 했다. 2008년 아트 바젤 홍콩의 모태가 된 홍콩 아트 페어(Hong Kong International Art Fair)가 설립되면서 미술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무렵 가고시안, 리먼 머핀, 화이트 큐브, 페로탱 같은 ‘스타’ 갤러리의 아시아 분점이 속속 입성했다. 이어 2013년에는 굴지의 아트 페어 브랜드 ‘아트 바젤’을 운영하는 스위스 MCH그룹이 홍콩 아트 페어를 인수했다. 홍콩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좁게는 아시아, 멀게는 서구권의 미술계 인사와 컬렉터가 홍콩을 찾았고, 이에 발맞춰 정부와 비영리 예술 기관, 갤러리가 모여 ‘아트 주간’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 마이애미 역시 2002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Art Basel Miami Beach)가 처음 열린 이래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했다. 그사이 대규모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중소 갤러리가 속속 생기는 등 생태계가 다양해진 건 물론이다. 마이애미가 ‘나른한 휴양 도시’에서 세련된 건축과 디자인의 도시로 변모한 데에는 아트 바젤의 공이컸다는 평가다.
다양한 매력이 숨어 있는 부산의 잠재력
아트 페어는 지극히 자본 친화적 행사다. 그래서 각 도시 고유의 인프라를 대폭 활용하는 ‘지역 축제’로서 확장성을 지닌다. 넓은 해변과 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의 풍경을 거느린 부산은 흔히 LA와 마이애미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살짝 어정쩡한 이미지를 뿜어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산은 다면적 매력을 품은 도시다. 첨단 도시를 향해 달리는 대도시지만 임시 수도로서 역사, 근대 도시의 형성과 개발 과정에서 남은 흔적은 오늘날의 부산과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산의 독특한 풍경은 예술적 토양이 되기에 충분하다. 오래된 수리 조선소와 낙후된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 그리고 산복도로 등 구도심의 모습을 간직한 공간으로 거리로 미술을 이끌어 내어 시공간을 넘나드는 혼성적이며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간다. 지난 10여 년간 도시 재생 정책으로 진행해온 예술 마을 조성 사업, 가령 감천 문화마을이나 영도 흰여울 문화 마을, 장림포구, 깡깡이 예술마을의 벽화와 공공 조형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 예술 콘텐츠는 다시 아트 페어나 비엔날레의 장외 프로그램과 연계되면서 부산 특유의 정체성과 동시대 미술이 결합한 흥미로운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낸다. 사실 아트 페어, 비엔날레 같은 행사의 역할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 자체의 활력과 더불어 아트 부산의 꾸준한 성장은 외부로부터 컬렉터와 아트 딜러, 큐레이터, 작가 등 다양한 층위의 미술 관계자를 끌어 모으며 다양한 아트 인프라에 대한 수급을 부추기고 있다. 망미동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F1963이 대표적 사례다.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협력해 폐공장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이 복합 문화 단지의 등장을 계기로 일대가 긍정적 변화를 맛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메이저 화랑인 국제갤러리가 F1963에 입점한 데 이어 인근에 가나아트 부산, 갤러리 메이 등 중소 갤러리가 모여들면서 일종의 아트 지구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비단 망미동에 한정된 변화만은 아니다. 향후 2~3년 안에 KT&G 상상마당, 부산 오페라 하우스 등 복합 문화 공간과 조현화랑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부산에 지을 예정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이다
물론 아트 도시의 가능성을 외연적 성장과 파급 효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예술적 토양을 뒷받침하는 기본 가치가 중요하다. 사실 부산은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지역 작가의 규모가 타 도시에 비해 작은 데다 컬렉터나 갤러리 숫자도 부족하다. 어쩌면 그래서 부산 미술계가 특정 사단이나 운동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는지 모른다. 자연스럽게 젊은 미술인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며 신선한 도전을 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을테고. 부산 미술계가 품은 청년성, 다양성, 개방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
[ART+CULTURE ′19 SUMMER SPECIAL]
1.Interview with_Erwin Wurm 보러 가기
2.Masterly tales_ Avignon 보러 가기
3.Masterly tales_Saint-Rémy de Provence 보러 가기
4.Masterly tales_Les Baux-de-Provence 보러 가기
5.Masterly tales_Arles 보러 가기
6.Masterly tales_Marseille 보러 가기
7.Masterly tales_Aix-en-Provence I 보러 가기
8.Masterly tales_In the Steps of Paul Cézanne – Aix-en-Provence II 보러 가기
9.아트부산(Art Busan) 2019 Open and Lively 보러 가기
10.부산,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다 보러 가기
11.Make it New – 한국 현대미술의 다채로움을 펼쳐 보이는 4인 4색 보러 가기
12.Christian Boltanski in Tokyo 보러 가기
13.Remember the Exhibition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