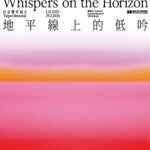1970년대 탄생했지만, 존재감이 미미했던 단색화가 2015년부터 세계 미술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미술 한류를 이어줄 뚜렷한 후속타의 부재에 대한 조바심과 한국의 현대미술이 ‘단색화’로만 국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 세계 무대가 좁은 듯 열심히 뛰는 작가들이 있다. 올해 해외 무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는
김종학(1937년생), 이강소(1943년생), 이불(1964년생), 강서경(1977년생) 네 작가를 소개한다.
리현대.
이불. 아르세날레 본 전시 설치 전경.
Maupin, New York, Hong Kong, and Seoul.
이 글의 제목 ‘Make it New!(새롭게 하라)’는 모더니즘의 구호가 된 20세기 미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의 명구를 차용했다. 물론 모더니즘으로 되돌아가자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부터 소개할 4인 4색 작가들이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전 예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름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김종학과 이강소는 국내 명성만으로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을 통해 세계 미술계에 지속적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불과 강서경은 소수의 약자 혹은 한국적 주제를 세계적 표현 양식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을 탐구하고 있다. 단색화가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면, 이 4명을 비롯해 지난해 글로벌 행보가 돋보인 이배 등 여러 작가가 최근 그 문의 폭을 더욱 넓히며 다양한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종학(Kim Chong Hak)
벽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큰 화면이 꽃으로 가득하다. 첫눈에는 모든 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듯 많고 다양해 ‘꽃’이라는 집합명사가 한 묶음으로 쏟아진다. 시간 여유를 두고 바라보면 꽃이 하나둘 점점 친근하게 고유명사로 다가온다. 나팔꽃, 강아지풀, 할미꽃이 제각각 말을 걸어온다. 꽃뿐이 아니다. 잘 익은 열매, 꽃 위를 나는 새, 꿀에 심취한 벌, 날개를 활짝 펴고 꽃잎에 방금 안착한 나비, 풀잎 사이로 슬그머니 거미집을 치기 위해 나오는 거미 등이 차례차례 등장한다. 빨갛고, 파랗고, 샛노랗고, 하얗고, 까만 온갖 원색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신기하게도 잘 어울린다. 마치 자연 속에서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핀 원색 꽃이 어디에서나 조화를 이루듯이, 그런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이 있다. 어느덧 화폭에는 처음 시선을 둘 때보다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듯하다. 화면에 가득한 꽃 사이에 안착한 곤충이 와글대는데도 번잡하거나 시끄럽지 않다. 보티첼리의 명작 ‘봄(Primavera)’처럼 모든 등장인물과 요소가 중요해 원근법을 적용할 수 없듯이, 김종학의 그림을 보면 모든 식물과 곤충이 똑같이 중요하기에 ‘절대 평등’이 실현된 유토피아가 느껴진다.
이러한 꽃 작업 때문에 한국에서 ‘산의 화가’, ‘바다의 화가’ 등으로 불리는 작가가 유럽에서는 ‘꽃의 화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빽빽한 꽃 뒤에는 설악산이, 강릉 바다가, 한국의 하늘과 정서가 펼쳐진다. 꽃이 너무 진짜 같아 실제로 벌이나 나비가 날아들 정도는 아니다. 노자가 말한 ‘대교약졸(大巧若拙)’처럼 큰 솜씨지만 오히려 다소 서툴게 보이는 면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서구의 ‘키치’와 동양의 ‘서투름’, 좀 더 정확히는 ‘능숙함을 넘어 저절로 서툰 맛’과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나 싶다. 화면 전체에 균일하게 페인팅하는 올오버(all-over) 회화 작품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답답함과 숨 막힘이 이런 ‘서투름의 미학’ 덕분에 한층 여유롭고 자연스러워진다. 이 매력을 알아보는 팬층은 이제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파리 기메 국립 동양 박물관의 개인전 이래 아트바젤 홍콩, 페로탱 갤러리(파리, 베이징) 등으로 이어지는 최근 세계 무대에서의 분주한 활약은 그 방증이다.
이강소(Lee Gang So)
한국 1세대 아방가르드 작가 이강소는 얼마 전까지 베니스의 팔라초 카보토(Palazzo Caboto) 전시장에서 개인전 <Becoming>을 치렀다(2019.5.8~6.30). 국내에 ‘오리 작가’로 알려진 그가 서구에 처음 들고 간 조류는 오리가 아닌 ‘닭’이었다. 1975년 제9회 파리 비엔날레에 참가해 당시에도 혁명적이던 ‘닭 퍼포먼스’를 펼쳤다(‘무제 75031’). 전시장 가운데 말뚝을 세운 뒤 살아 움직이는 닭의 다리에 끈을 묶어 연결했고, 이 닭은 석고 가루를 뿌려놓은 원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독특한 발자국을 남겼다. 비록 닭이 사라졌을지라도 관람객은 그 흔적을 보고 ‘현전(presence)’이 이뤄진다(장 폴 사르트르의 주장처럼 ‘부재한 대상을 현전화(現前化)’한 것). 프랑스의 상징이 ‘수탉’이기에,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유하기 좋아하는 프랑스인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처럼 생물을 퍼포먼스에 이용한 것은 전위미술가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의 ‘코요테,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도 나를 좋아한다’(1973)에서 코요테가 등장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에서 코요테는 혼자가 아닌 보이스와 함께였다(보이스는 3일간 코요테와 함께 지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1990년대에 ‘살아 있는 파리’가 등장한 데이미언 허스트의 ‘천년’이 제작됐고,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가 ‘벌’이나 ‘강아지’를 전시에 등장시킨 것은 2000년대다. 이강소가 파리 비엔날레를 계기로 유럽에 남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 이유다.
‘닭’이 한국으로 오면서 ‘오리’(물론 중간에 ‘사슴’, ‘배’도 있었지만)로 변화되고,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들어간다. 오리는 물 위를 둥둥 떠다니거나 아장걸음으로 지면을 걷지만, 동양화의 여백처럼 물과 지면은 여백으로 처리된다. ‘오리’라는 모티브를 통해 관람객은 오리의 여유롭거나 급한 움직임, 물결, 대지의 흔적, 공기의 흐름 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닭’이 사라지듯이 오리의 존재도 점점 희미해진다. 하지만 오리와 그 주변 공간의 관계성은 도드라진다. 보통 ‘격물치지(格物致知)’라 하면,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지(知)에 이르는 것’을 뜻하지만, 이강소의 경우 ‘지’(知)가 ‘인식론’이나 ‘존재론’보다는 ‘현상학’이나 ‘관계론’으로 해석된다.
강서경(Suki Seokyeong Kang)
올해 열리고 있는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5.11~11.24)는 영국 헤이워드 갤러리 관장 랠프 루고프(Ralph Rugoff)가 총감독을 맡았다. 그가 내세운 주제는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이다. 1930년대 영국 정치가 오스틴 체임벌린의 말로 ‘흥미로운 시대[난세]를 살아보라’는 중국의 저주문을 차용했다고. 한데 정작 중국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니, 소위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불분명한 ‘시뮬라크르(Simulacre)’가 넘쳐나는 시대에 걸맞은 주제다. 강서경은 한국인 최초로 격년제 예술상 ‘휴고 보스’상을 받은 아니카 이(Anicka Yi, 1971년생), 그리고 뒤이어 다룰 이불 작가와 함께 비엔날레 본 전시에 초대됐다(총 79명(팀)). 아르세날레 전시장에 설치한 그의 작품 중 ‘땅 모래 지류(Land Sand Strand)’는 땅에 흩어진 모래가 모여 지류를 이루듯 지구상의 개개인이 사회를 구성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춘앵무’와 ‘정간보(井間譜)’ 같은 우리의 고전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조선 세종 때 소리의 길이와 높이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만든 악보 ‘정간보’(井자 모양으로 칸을 나누고 그 속에 율명(律名)을 기입했다)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가장 앞선 유량악보(有量樂譜)이며, 효명세자가 만든 ‘춘앵무’는 가장 수려한 궁중 1인무 중 하나로 꼽힌다. 강서경은 악보에 그린 ‘음’과 무보(舞譜)에 그린 ‘움직임’(춤)을 회화, 조각, 영상 등으로 재현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요한 모티브를 고전에서 찾아내 케케묵은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고,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시각화하고 현대적 예술 언어로 승화한 것이다. ‘땅 모래 지류’의 영어 제목은 ‘Land Sand Strand’인데, 각운(脚韻)이 ‘and’로 끝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리라. 독일 신학자 마르틴 부버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처럼, 관계가 존재에 앞선다. 즉 ‘너’, ‘나’의 존재보다 ‘과(and)’라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땅(Land)’이 ‘모래(Sand)’가 되고, ‘모래’가 ‘땅’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그 관계성은 ‘지류(Strand)’로 재현되고, 이 모든 관계는 ‘and’로 엮인다.
이불(Lee Bul)
최근 조명받거나 재조명받는 세 작가와 달리 이불은 이미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1997년에 열린 뉴욕 현대미술관(MoMA) 개인전에서 소수 약자의 고통을 생선의 악취로 재현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이불은 이듬해 휴고 보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또 1999년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대표 작가를 맡은 동시에 전설적 큐레이터이자 평론가 하랄트 제만(Harald Szeemann)이 총감독을 맡은 본 전시에 초대되어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 미술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 이불은 20년 만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돌아왔다. 이불은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 세계 열강이 통일과 평화보다는 이권 다툼의 원격 각축장으로 삼아 그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철거 과정에서 나온 해체물로 ‘오바드 V’(Aubade V, 400×300cm)를 만들었다. 철조망을 비롯한 해체물 600kg을 녹여 만든 이 작업은 4m 높이의 3층 철탑에 층마다 달린 날개, 빛을 발하는 전구, 모스부호, LED 표지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불의 작업은 근대의 실패한 이상주의, 어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실현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 오랜 망상이던 백색 신화, 근대 서사, 이미 해체된 거대 담론을 읊는다.
그러나 외형적 형식과 달리, 이불의 작품은 지독히 현실적인 현재의 문제를 다룬다. 1989년의 ‘낙태’ 같은 그의 초기 작업을 보면 동시대 약자의 아픔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승화되고 숙성되어 나타난다. ‘일시적이며, 덧없고, 우연적 현실’의 아픔을 ‘영원하고 불변한 예술’로 승화하려는 고뇌가 드러나 있다. 그의 예술 한편에는 현재성과 일시성의 미학이, 그 반대편에는 불안한 영원성의 미학이 발견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 안에서 ‘불안한 자극’을 즐기며 방랑의 유희를 일삼는 것이 우리 몫일 테고. 이불의 작품을 찬찬히 감상하다 보면 19세기 후반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말이 떠오른다. “모더니티는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 우연적인 것으로 예술의 절반이며,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것, 불변의 것이다.” 글 심은록(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
[ART+CULTURE ′19 SUMMER SPE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