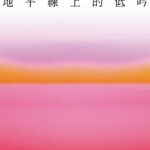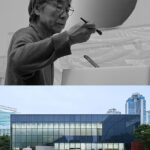컬렉터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 비록 그것이 반드시 먼 훗날의 작품 가치를 담보하지는 않겠지만 동시대 미술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영예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1978년생, 한국 나이로 아직 30대 후반인 미국 태생의 작가 헤르난 바스(Hernan Bas)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작가다. 수줍음이 꽤 많고 별로 사교적인 성격이 아닌데도 골수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그를 FIAC 아트 페어 기간에 파리에서 만났다.
2 미국 마이애미 출신의 쿠바계 혈통인 헤르난 바스. 사진 Guillaume Ziccarelli
세계적인 갤러리 페로탱이 자리한 파리 3구의 튀렌 거리(Rue de Turenne 76). 근처 카페에서 헤르난 바스의 작품 세계를 담은, 2백7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넘겨보고 있노라니 흘깃 쳐다보며 지나쳐가는 행인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강렬한 색감과 몽환적이면서도 긴장감 흐르는 구성, 탐미주의적인 스타일, 그리고 그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연약해 보이는 소년 캐릭터들 때문일까. 확실히 그의 그림에는 시선을 확 잡아끄는 뭔가가 있나 보다. 주로 얇은 리넨 위에 아크릴을 사용한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솜씨가 좋은 헤르난 바스. 추상과 뉴 미디어, 설치 작업이 지배하는 현대미술계지만 그는 꾸준히 회화에 몰입해온 작가 진영에 속한다(가끔 다른 설치물도 하지만).
쿠바 출신의 부모를 둬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머리색이 짙은 그는 일찍이 커밍아웃한 게이 화가로, 초기에는 작품에 소년들을 유난히 자주 등장시켰는데, 묘한 성적 긴장감과 혼란스러운 내면이 다분히 묻어났다. 엄청난 독서가이기도 한 그는 오스카 와일드 같은 작가의 탐미주의 문학과 낭만적인 신화에 푹 빠졌던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19세기 고전을 여린 감성과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어린 작가가 눈에 띄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4 2012년 PKM갤러리에서 열린 헤르난 바스의 개인전 . 사진 제공 PKM갤러리와 작가
이런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그가 지난해 여름을 보낸 남프랑스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니스에서 머물렀는데 거장 마티스에 완전히 반했다고(그는 데 쿠닝, 호크니 등 시대를 막론하고 선배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항상 얘기한다). “마티스가 살던 곳 바로 옆에서 지내면서 그의 무덤에도 가고 미술관에도 가고 성당에도 갔어요. 니스의 풍광, 마티스의 색채에 매료되면서 저도 약간은 밝고 대담해진 것 같아요. 구성은 피에르 보나르의 영향도 받았고요.”
사실 마이애미도 햇살이라고 하면 많이 뒤처지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심정적으로도 더 안정을 찾은 것일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맞아요. 뭔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는 하지만 제 스스로 좀 더 안정되고 밝아진 듯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쩌면 불안(angst)이 이제는 습관처럼 몸에 배어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작품들도 왠지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는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파트너(남자 친구)도 있고, 스튜디오랑 집도 있는데 그렇게 불평할 거리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웃었다. 헤르난 바스는 우연히 14년 전 현재의 연인을 만나 그의 고향인 디트로이트와 마이애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마이애미로 돌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춥든 덥든 정원 가꾸기와 낚시, 독서를 빼고는 별다른 취미도 없이 일만 들이파는 ‘워커홀릭’이다. 그는 알코홀리즘처럼 워커홀리즘이란 게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면서 “따분하고 권태로운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듯하다”라고 했다. 물론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할 만큼 작품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다(이번 전시 작품들도 여지없이 첫째, 둘째 날에 대부분 팔려나갔는지, 작품 리스트에는 빨간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감사한 일이죠. 신기하지만 제게는 어릴 때부터 전적으로 옹호해주는 컬렉터들이 있었어요. 제가 후원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거나 하는 사교적인 성격이 전혀 아닌데도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배후에서 제 커리어의 성공에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화랑에 저를 소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처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온 컬렉터 중에는 미술계의 큰손 루벨 부부도 있다. 앤디 워홀, 리처드 프린스 등 현대미술 대가들의 작품을 신인 시절부터 사 모은 것으로 알려진 부부다.
그러고 보니 헤르난 바스는 참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네 살 때부터 그림에 눈을 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화가의 꿈을 버린 적이 없다는 그는 뉴욕의 미술 대학인 쿠퍼 유니언에 입학했지만 곧 따분해졌고, 자신만의 드로잉을 하고자 그만뒀다(그는 수업을 듣지 않다 보니 퇴학당했다고 고백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는 벌써 20년 가까이 하나의 커리어 여정을 꾸준히 밟아온 것이다. “사실 ‘중진’이라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스스로 중견 작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직 마흔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다. 아직 마흔도 되지 않았다. 리졸리(Rizzoli) 같은 저명한 출판사에서 작품집을 낼 정도로 괜찮은 커리어를 이미 쌓았지만 그는 아직도 젊다. 호기심도 무척이나 풍부하다(그래서 더 쉴 틈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고전문학을 읽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미술 서적을 사 모으고 읽고, 또 열심히 그린다. 요즘 관심 있는 작가 이름을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온다. 그래도 그에게 영감과 영향을 주는 ‘우상’은 대부분 윗세대다. 가장 동경하는 동시대 작가도 80대를 코앞에 둔 데이비드 호크니이니 말이다. 그는 호크니가 인스타그램에서 ‘맞팔’을 해준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대한 순간이었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호크니가 최근 많이 선보이는 커다란 풍경화에 대해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작업 중’인 작품 사진을 보여줬다. 평생 가장 큰 규모로 시도한 ‘대작’인데, 곧 중국에서 가질 첫 전시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귀띔하면서. 3년 전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전시를 한 적이 있는 그는 “제 ‘절친’도 한국인이에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죠”라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금방은 아니어도 작품을 갖고 꼭 다시 찾을 테니 기다려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때쯤이면 또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