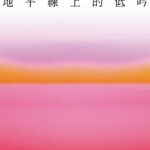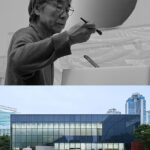20세기 초에 런던, 파리와 자웅을 겨루며 글로벌 메트로폴리스로서의 입지를 열심히 다지고 있던 밀라노에서는 ‘만국박람회’라 불리는 큰 행사가 열렸다. 진한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풍성하게 얹은 카푸치노라는 존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널리 공개된 1906년의 엑스포다. 그로부터 무려 1백9년 만인 2015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련미 뚝뚝 떨어지는 이 도시는 다시 엑스포의 무대가 됐다. 지난 5월 1일 개막해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의 대장정을 펼치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의 주제는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볼거리와 고민할 거리를 동시에 안겨주는 밀라노 엑스포 현장을 가봤다.
2 미식가의 나라이자 낙농 대국답게 현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선보인 프랑스관.
3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넘쳐난 독일관.
4 이탈리아관 옆 아레나 호수 근처에 설치된 ‘생각의 나무’. 음악과 조명, 물이 어우러진 휴식처가 된다.
만국박람회의 시초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긴 세월이 흐른 만큼 월드 엑스포의 모양새는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각국에서 각종 공산품과 공예품을 내놓으며 산업 경쟁력을 자랑하던 행사였다면, 이제는 인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진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다분히 문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신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일단 저마다의 특색이 묻어나는 파빌리온(pavilion, 국가관) 디자인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할 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흥을 돋운다. 이번 밀라노 엑스포 주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식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에 꽤나 잘 어울린다. 물론 먹을거리가 주제라고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내용을 다룰 리는 없다. 즐겁고도 올바른 먹을거리를 지향하는 건강한 식문화와 첨단 기술을 등에 업은 산업 차원의 고민, 해마다 세계 식량의 1/3에 해당하는 13억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되짚어보며 낭비를 지양하는 건전한 식습관, 아직 지구촌의 많은 곳에서 비일비재한 굶주림을 없애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 등 폭넓고 깊이 있는 ‘사색의 장’이 전개되고 있다. 요즘 인류의 ‘제대로 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핫한’ 주제인 만큼 세인의 관심도 뜨겁다.
밀라노는 이미 패션, 산업 디자인, 건축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상업 도시지만 이번 엑스포에서는 특히나 야심을 불태우는 눈치다. 한 세기 남짓 만에 다시 개최하는 행사인 데다 좀처럼 경기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 대륙의 자존심을 대신해서라도 옹골지게 치러내겠다는 의도가 버티고 있는 듯하다. 국제박람회사무국(BIE)에서 공인하는 엑스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5년마다 개최돼 ‘문화 월드컵’으로 통하는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po), 그리고 등록 엑스포 사이에 더 작은 규모로 열리는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po)다. ‘큰 엑스포’와 ‘작은 엑스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2010년 역대 최다인 1백89개 참가국과 7천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상하이에 이어 밀라노에서 ‘큰 엑스포’가 열리게 된 것이다(1993년 여수, 2012년 대전에서 열린 엑스포는 둘 다 ‘작은 엑스포’였고, 현재 부산에서 유치를 준비 중인 2030 엑스포가 ‘큰 엑스포’다). 성장 가도를 달리는 인구 대국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1백40여 개국이 참가한 이번 밀라노 엑스포는 총 2천만 명의 관람객, 50조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치로 잡아놓은 채 나름 쏠쏠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개막 전부터 조직위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잡음이 있어서인지 밀라노 현지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개막식이 연기되는 등 엉성한 면모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엑스포답게 볼거리는 풍부했다. 일단 전시장이 로마의 도시처럼 세로로 길게 뻗은 ‘데쿠마누스(decumanus)’라는 긴 길과 이와 교차되는 ‘카르도(cardo)’를 주축으로 한 직선형이라 보기에 시원한 느낌을 자아낼뿐더러 길 찾기도 편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정돈된 느낌으로 늘어서 있는 각국의 파빌리온 디자인이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건물 겉면을 녹색 풀로 장식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낸 경우가 눈에 많이 띄었다는 것이다.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 파빌리온이지만 엑스포를 역량 겨루기가 아니라 문화적인 공유와 진지한 성찰을 꾀하는 장으로 삼자는 ‘성숙해진’ 취지에 맞게 설계된 셈이다.
6 입구에 설치된 그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브라질 파빌리온.
7 숲을 주제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찬사를 받은 오스트리아관.
8 푸드 트럭이 돋보이는 미국관.
10 규모 있는 LED 설치물로 시선을 사로잡은 중국관.
11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삼은 세련된 외관의 한국관. 사진_엑스포 사무국 제공(4번은 독일관 제공), 11번은 Pietro Baroni, (1~3, 5~10번은 Daniele Mascolo).
‘한식, 미래의 음식’이라는 타이틀을 선택한 한국관은 엑스포장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가관 중에서 단연 눈에 띈다.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파빌리온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된 편이다. 1층에는 CJ푸드빌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에서 운영하는 한식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고, 2층에 위치한 전시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조화, 발효, 저장 등 한식의 특징적인 개념을 다루는 데 집중했다. 다른 국가관에 비해 스크린으로 도배하기보다는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콘텐츠에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묻어난다. 특히 미디어 아트를 감각적으로 잘 활용했다. 로봇 팔이 2개의 스크린을 움직여 펼치는 영상쇼는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3백65개 옹기 뚜껑에서 꽃이 피고 김치로 변모하면서 발효의 시간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개념적이라서 어렵다’, ‘시각적으로는 근사하나 군침을 돌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쓴소리도 듣고 있다. 아트 차원에서는 수준이 높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걸음마 단계인 한식의 묘미를 전달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체험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심장 소리로 생명을 표현했다는 높이 3m에 이르는 대형 옹기는 시각적으로는 강렬할지는 모르지만 그 의도에 감탄하거나 즐거운 공감을 하기는 힘들다. 한식의 우수함만 개념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음식 자체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발산해야 할 단계가 아닐까.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관은 전시관 밖에는 알록달록한 쌀자루를, 안에는 스시, 우동 등 자국을 대표하는 음식 모형을 얄밉도록 예쁘게 포장해 선보였고,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상으로도 일본의 식문화와 자연을 마음껏 뽐낸다. 전시가 끝나면 절로 일식을 먹고픈 충동을 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렇듯 시각적 효과로 입맛을 돋우는 데 성공했지만 정찬 메뉴가 1백유로를 훌쩍 넘을 정도로 심하게 비싼 메뉴는 일본관의 흠으로 여겨진다. 아무리 프리미엄 이미지를 누리고 있는 일식이라지만 유럽에서도 ‘미식의 대중화’가 큰 흐름을 타고 있는 현 추세에서, 그것도 대중이 모여드는 엑스포장에서 내놓는 음식의 가격대로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맛깔스럽게 현지화된 데다 가격이 적당히 ‘착한’ 한식은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오늘날 식문화 개혁 운동은 비싼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맛과 가격의 조화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까지 고려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탐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밀라노 엑스포는 놀랄 정도로 다채로운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food for thought)’를 주는 행사가 될 듯하다.